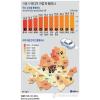/
*
라이벌이었달까.
어려서부터 두 집안이 이런저런 관계로 얽혀있고
결정적으로 종내엔 집안끼리 사돈간이 되고야 말았는데
그 중에 한넘이 이몸과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
당시엔 서로 친구간이었지.
이넘은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여자애도 잘 꼬였더랬는데
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뒤돌아보면 나에게 출처불명의 시기, 질투를 갖고 있었나 봐.
열가지 중 단 한가지라도 지보다 내가 더 잘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
특이한 열등의식의 소유자.
*
세월이 흘러
그 넘은 어엿하게도 대기업에 입사, 빠른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서 당시 그룹 최연소 자회사 상무쯤 된 시기였어.
그 때 난 그 나이되도록 유흥가에 카페나 차려서 젊음을 물쓰듯 허비하면서
일하는 여자애들 종아리나 음험히 쳐다보면서
손님이 마시고 간 술이나 빨고 있었겠지.
그런 어느날 시골 고향에서 동창회가 열렸어.
그 해 주관이 상경해서 나름 출세한 넘들이 많았던 동기들이라 당시 고향이 엔간히 시끄러웠지.
집안 형, 누나들 찾아오라는 부모 성화에 초교 운동장을 찾아갔다가 그만 동기들한테 붙들려서
본의아니게 그넘들과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어.
*
그 동창회 뒷풀이의 주인공은 당연히 그 넘이었어.
겸손을 떠는 척도 잠시, 이내 얼마지 않아서 아주 내놓고 배때지를 내밀고 있더군.
난 넘들끼리 지들 자랑질허느라 좌중이 쉴새없이 떠들석할 때 그중 언넘이 내게 술잔을 내밀며
"넌 요즘 머허냐? 동창회에 코빼기도 안 뵈고.."
순간 떠들석한 좌중에 잠깐동안 정적이 흘렀어.
"걍 논다."
이내 분위기는 다시 떠들석함을 되찾고 으례 곧 화제가 다른 데로 흘렀지만
어쩐지 분하달까 초라하달까 그런 심사에 난 얼른 자리를 뜰 구실을 찾고 있었지.
그걸 눈치 챘는지 그날의 주인공은 내 이름을 크게 불러서 뭇시선들은 다시 나를 향하게 되었지.
씨익 썩은 미소를 날리면서
"자슥..'
그것은 오랜 라이벌을 링에서 눕히고 회심의 미소를 띠고 돌아서는 득의의 미소였어.
그때 난 더 참아야했었어.
돌아서는 내 어깰 붙들고 좀 더 승자의 쾌감을 이어나가고픈 그넘의 의기양양한 시선을 마주쳤을 때.
난 마귀의 부름을 들었어.
좌중이 성공한 촌넘들의 서로의 무용담에 슬쩍 피로감이 찾아온 순간.
강제로 이끌려 곁에 앉아 뭔 주고받는 말 끝에 그넘과 나, 둘의 대화가 룸에 조용히 울렸어.
나의 출세 못함을 측은하게 위로하던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그넘의 진심어린^^ 위로의 말 끝에
난 선선한 얼굴로 말을 이었어. "다시 선택할 수 있어도 내 허접한 삶이언정 너랑 바꿔줄 맘은 없다."
대략 이런 의미었어.
근데..
근데 갑자기 이넘이 도는 거야
만면에 머금던 득의의 웃음이 싸악 걷히더니 순간 테이블 술병, 안주접시들이 허공을 비행하기 시작했어.
"병ㅅ새끼"
난 그 자리를 걷어차고 나왔고
그게 그넘과의 마지막이었어.
*
인생을
부산톨게이트에서 서울 톨게이트까지 직선으로 내리 밟아 객관적으로 성공한 길은
길을 잘못들어 낯선 국도에 접어들며 보게되는 삶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그 뒤안길을
결코 볼 수 없을 것이므로..
지금도 난
어린 아들에게 무책임하게도 이렇게 말하지
"너무 행복하게 살려고 애쓰지마라. 너다운게 뭔지 몰라도 그리 살아보려 해라."
"헐~"
아들 넘은 여전히 뜬금없다는 얼굴이다.
/
꽃이 지고서야
봄이 지났슴을 알다.